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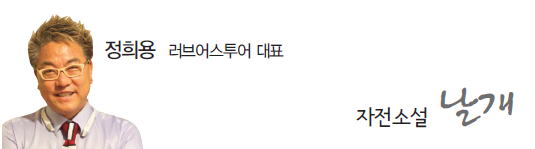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 원대한 꿈을 안고
2. 도전
3. 추억으로 넘기기엔
4. 정신 바짝 차리자
5. 겸손과 인생
6. 서글픔
7. 푸른 바다와 파도가 되어
8. 영원한 날개
‘태국어 학습장’ 술집
자기투자가 중요한 시점, 실제로 500달러가 채 남아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매일 매일 밤을 회사 근처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입구 옆에는 자그마한 주차장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촌스런 휘황찬란한 불빛이며, 영어로 ‘카사노바’라 적혀 있는 술집이었다.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리며 미모의 종업원이 초록색의 미니원피스를 입고 자그마한 손전등으로 좌석을 안내했다.
실내는 어두웠는데 들어가는 좌측엔 영화에서 본 듯한 바에서 종업원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며, 오른쪽으로는 홀에 앉아 술을 마실 수 있는 좌석이 4~6개 있었다. 바로 그 앞 무대에는 내가 좋아하는 라이브 연주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세계다.
그러나 난 주머니에 많지 않은 돈이 있었고, 술값도 정확히 모르고 들어가 첫날부터 홀의 좌석에 여유 있게 앉지는 못했다. 그냥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였던, 좌측의 바에 앉아서 맥주를 시켰다. 바로, ‘크로스터 비어’.
훗날 내가 제일로 좋아하게 된 태국 맥주이자, 당시 싱하 비어보다 가격이 조금 높았다. 1989년 당시 태국 환율이 25대 1로, 맥주 한잔이 250바트, 한화 6250원 정도로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 가격이 비싼 줄도 몰랐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기에, 그저 외국이면 다 우리나라보다 비쌀 것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난 바에 앉아서 처음 보는 태국 아가씨와 회사에서 배운 타이 문장을 써먹기 위해 몸짓, 손짓을 해가며 대화를 했다. 늘 조그마한 메모노트를 가지고는 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가이드 고참 중 몇 명이 나를 같이 술집에 데리고 다녔다. 이후 남들과 비슷한 태국어의 생활습관이 술집부터 학습돼버린 것이다. 팁문화도 그때 겪었다. 워낙 팁문화를 겪어보질 않은 상황과 나이였으니까. 이후 그 술집에선 내가 가면 아가씨들이 환대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
한번은 회사에서 태국어로 “재떨이 좀 부탁합니다”라는 문장을 배우면 그 술집에 가서 그것을 시도해보기 위해 내 앞에 있던 재떨이를 몰래 저만치 치워놓았다. 그리고는 태국어로 “커~티캐어부리 캅”이라고 했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다. 매일이 그런 식이었다. 난 그날 그날 배운 태국어를 그렇게 활용해 나갔던 것이다.
그 술집을 2개월 정도를 다니던 어느 날, 태국어를 잘 모르던 나에게 아가씨가 말을 건네 온다. 그것도 푸껫을 놀러가자고 말이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제공해, 방콕시내와 방콕에서 한 시간반가량에 위치한 아유타야 정도만을 찾아다닐 수 있었다. 교통체증과 생활상 정도만을 습득해온 나에게 푸껫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니,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 생각도 했다. 일단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