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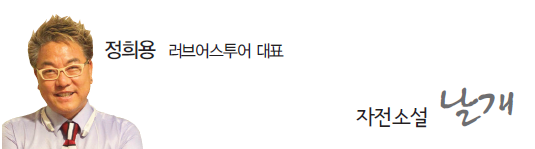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 원대한 꿈을 안고
2. 도전
3. 추억으로 넘기기엔
4. 정신 바짝 차리자
5. 겸손과 인생
6. 서글픔
7. 푸른 바다와 파도가 되어
8. 영원한 날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일
우리 회사 거래처들에게 가이드 지명을 받으며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시절, 어느새 나는 거만해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파타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의 멘트는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었다. 준비돼있는 설명이 어디선가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설명이 나가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리 가이드를 오래했어도 늘 다시 한 번 무슨 설명부터 할까 한번 생각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맞이했는데, 이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
늘 내려가는 그 파타야 길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알카자쇼장 가이드 대기실에서 여자 T/C(인솔자)가 “정희용씨 실망했어요. 남들이 태국 가면 가이드로 꼭 정희용씨를 지명하라고 해서 했더니. 왜 지명하라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라고 말했다.
순간 모든 물체가 정지돼있고 아주 오래된 흑백사진의 내 모습이 뭔가 답답하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애써 변명하듯 바로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네요”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그 행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났다. 어느 만화에서 본 것처럼 유리턱이 생각났다. ‘그래 난 유리턱이었어. 순간 쉽게 부서질 수도 있는’. 그날 이후 가이드 지명이 들어와도 아직 안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회사에 말을 한 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이드 매뉴얼 및 참고 자료를 꺼내봤다. 다시 공부에 전념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나에겐 정말 큰 성숙이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인솔자 분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치 바로 앞에 앉아있는 듯하다.
가이드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좀 빠른 듯 싶었지만 회사를 하나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당시 가이드 동기생들이 내근직(오피 실장)으로 옮기고, 쇼핑몰(휴게소)을 차리고 가라오케를 인수하는 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이었던 것 같다.
1994년 2월1일 방콕 사무실과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오픈한 나는 큰 꿈에 부풀어 있었다.
“너는 아직 더 배워야 해. 지금 회사 차리면 잘 될 것 같으냐! 성공이나 하겠어!”라는 선배의 말을 뒤로하고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래 꼭 성공 하자!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꼭 성공하자!’ 훗날 성공이 꼭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게 성공이 아니란 걸 알았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1874~1922)이 “성공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난 내 컴퓨터 모니터위에 이 글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쳐다본다.
그러나 IMF는 역시 나 또한 비켜나가지 못했다. 서울에 출장 나와 있는 사이 자금회전이 안돼 방콕사무실에 전기가 끊기고, 직원들도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지게 됐다. 방콕 사무실마저 임대료가 밀려 결국 집사람이 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에 새벽녘에 도착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날 난 뭐했을까. 공항 마중도 안 나갔던 것 같다. 아마 그 전날 신세한탄을 하며 누군가가 사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자고 있었던 것 같다.
방콕 사무실은 큰 자물쇠로 잠기고 서울 사무실마저 닫고, 한동안 인천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그리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서울의 타 랜드 사무실, 여행사 사무실의 한쪽 구석진 책상에서 혼자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여자 OP가 했던 견적서 양식이 들어있는 플로피 디스켓만 가지고 다니며 컴퓨터를 독학했다. 한글파일 활자가 깨지면 늦은 시간이라도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 둘씩 배워가던 그 시절 피맛골의 구석진 내 책상이 지금은 그리워진다. 어려웠던 시절 늦은 밤까지 혼자남아 그 사무실에서 꿈을 다시 펴보았던 그날이 바로 엊그제같이 떠오르며, 두근거리는 가슴과 눈시울이 나를 더 멋진 놈으로 만들고 있다.
계단을 따라 내려와 피맛골 허름한 골목길의 전집, 생선구이집 등. 모두가 닫혀있던 깜깜한 그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깊게 한숨 쉬듯 내뱉는 담배연기가 교보문고 빌딩 꼭대기까지 피어올라 어지럽게 흩어지던 나날들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이 나에게는 참 행복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인천에서 서울로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서울 녹번동에 지하 월세방을 얻어주셨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혼자 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녹번동에 내리면 집사람이 두 어린애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와줬다.
속으로 많이 울었다 “그래 다시 성공하자. 인생 뭐있어” 어린애들과 손잡고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라갔다.
뒤따라오는 그림자 넷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봉원사에 걸려있는 달이 좀 쉬면서 가도 된다고 했던 밤으로 기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