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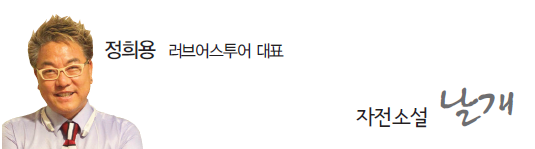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 원대한 꿈을 안고
2. 도전
3. 추억으로 넘기기엔
4. 정신 바짝 차리자
5. 겸손과 인생
6. 서글픔
7. 푸른 바다와 파도가 되어
8. 영원한 날개
호사다마(好事多魔)
속으로 많이 울었다. “그래 다시 성공하자. 인생 뭐있어”
피맛골 5층 거래처여행사의 구석진 책상 자리에서 4층으로 내려와 단독사무실을 얻게 됐다. 여직원도 한명 채용했다.
어느 이른 아침 푸켓 현지 모 여행사 사장과 그동안 방콕서 알고 지냈던 후배 한명이 우리 사무실로 찾아 왔다. “정사장 지금 시기도 힘든데 푸켓가서 다시 가이드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어?”
순간 잠시 잊고 있었던 태국 현지 생활이 떠올랐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푸켓에서 다시 시작해서 방콕으로 다시 입성하는 거야. 푸켓이면 어때”하며 그날 곧바로 집사람과 상의했다. 그런데 집사람은 몇 달 전의 현지생활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반대를 했다. 난 뭔가에 홀린 듯 감언이설로 집사람을 설득했다.
그렇게 지난 1999년 다시 푸켓에서 새로운 가이드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엔 집사람도 같이 한 회사를 다녔다. 난 가이드 실장으로, 집사람은 가이드로 딱 1년을 가이드 생활을 했다. 이번에도 재밌게 일을 했다. 역시 두 번째 하는 가이드라 좀 더 노련(?)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방콕서 오너생활을 했던 터라 다시 한 번 회사를 차리고 싶었다. 방콕이 아닌 푸켓에서 말이다.
물론 역시 몸담고 있던 푸켓여행사 사장에게 욕을 좀 먹은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나. 하고 싶으면 하고야 마는 이 성미를?
2001년 2월1일은 러브어스투어를 재창립한 날이다. 방콕에서도 1994년 2월1일 오픈해 의도적으로 푸켓서도 2월1일로 한 것이다. 참, 회사 이름을 러브어스로 만든 이유는 집사람과 나와의 우리(US), 사랑의 러브(LOVE)를 생각해서 LOVE US(러브어스)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 때 혹자는 발음만 듣고 러브얼쓰(LOVE EARTH)냐며, 지구를 사랑하는 무슨 환경 단체냐 하는 말도 들었다. 전화상으로 발음하다보면 간혹 듣는 이가 러브하우스로 들어, 혹시 러브호텔이냐 아니면 성인용품 판매하는 곳이냐는 등 재미난 소리도 많이 들었다.
두 번째로 하는 회사라 심혈을 기울였다. 푸켓 사무실도 확장 이전해 사무실과 집을 분리하고, 2002년도에는 6인승 스포츠라이더도 구입했다. 그 후에는 신형 닛산 12인승 봉고차도 구입하고, 태국기사도 2명 채용했다. 내근직으로는 태국인OP 2명과 한국인OP 3명 그리고 관리 및 경리과도 따로 두면서 제법 크게 운영했다. 실제로 소속 가이드만 해도 38명이었으니, 그 당시 물량으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운영하던 회사 외에 3위 정도를 달리고 있었다.
약 3년간 정말 일에만 매달렸다. 아침에 출근해서 가이드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공항으로, 밤에는 술집에서 인솔자 정산과 접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4시가 기본이었다. 그리하여 회사 앞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3층짜리 건물과 회사근처 신규 타운하우스 2채를 사들였다. 그 사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를 푸켓에서 제일 좋고 비싸다고 하는 영국인재단 학교 브리티시 스쿨에 기숙사로 보내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도 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 가. 그 잘나가던 회사가 2004년 12월26일 쓰나미의 강타로 여행객이 주춤거리는 사이, 한국에 나와 모항공의 전세기 상품에 매진했다가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됐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회사자금이 쭉쭉 빠지더니 급기야는 매입한 건물들도 중도금을 치루기전에 헐값으로 넘겨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물량을 충족하기위해 값싼 패키지에 손을 댄 것이 치명적인 실패로 돌아왔다.
2007년 어느 바람 한 점 없고 하늘의 태양마저 이글거리던 날, 푸켓 법원에서 오라고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사가 운전하는 내 스포츠라이더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사업을 하는 사이 태국인에게 차용한 자금에 관련한 문제였는데, 그동안의 태국 생활경험도 많고 하니 대충 해명하고 돌아올 요량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이 잘못된 길이었다.
그날 너무나도 빠른 절차로 누구의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해명의 기회도 없이 일사천리로 교도소의 철창으로 들어가게 됐다. 정말이지 그날로부터 일주일간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다.
그때 나는 또 한 번의 생각을 했다. “너무 앞만 바라보고 와서 태국 정부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딱 한 달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던 저녁시간, “미스터정 집에 가라”는 태국 말이 크게 막사 안으로 들려왔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들어올 때 입었던 복장으로 추스린 후 철문을 열고 나가보니, 기사와 가이드 두어 명이 우산을 들고 맞이했다. 한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말 없이 아들을 꼭 포옹했다. 포옹한 두 팔엔 어느 샌가 뜨거운 눈물이 아들 등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러내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