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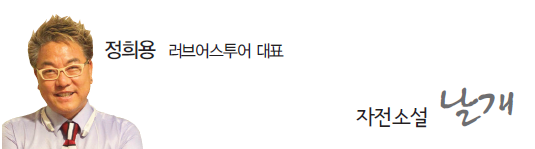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 원대한 꿈을 안고
2. 도전
3. 추억으로 넘기기엔
4. 정신 바짝 차리자
5. 겸손과 인생
6. 서글픔
7. 푸른 바다의 파도가 되어
8. 영원한 날개
고독한 러너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다 떠났고, 그래도 내 6인승 차량 한 대와 능글맞은 기사 통차이, 휴학계를 낸 아들. 이렇게 두 명 남아 있었다. 통장엔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끔 송금해 주셨던 돈 중 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남은 잔금 300여 만 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웃었다. 분리돼 있던 사무실과 집을 하나로 합쳤다. 며칠정도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동안 일에 매진하느라 못 만나본 사람들도 만나고, 아들에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저녁엔 같이 타이식으로 외식도 하며 대화도 나눴다. 방콕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과 같이 사우나를 다녔었는데 푸켓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던 사우나도 같이 다니며 남자로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들도 좋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해외생활이라는 게 본인이 힘들어지면 주변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유관 업체들, 쇼핑몰, 라텍스샵 하물며 식당 주인들도 나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랜드업이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나를 찾아 주는 거래처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타이 오피를 한명 뽑고, 서울에서 해외에 나가 근무를 원하는 여직원을 한 명 더 뽑았다.
2007년 가을의 시작이었다.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다시 시작하니 팀들도 하나둘씩 들어오고 가이드들도 7~8명가량 찾아 들었다. 그런데 그전엔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집사람의 역량을 모르진 않았지만, 지금은 집사람이 딸과 함께 방콕서 생활을 하기에 혼자서 이끌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이 랜드업은 한국으로 출장도 가고 사무실 자리도 비워야 할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일 년 정도는 잘 이끌고 버틴 것 같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 외로움과 괴로움, 우울함, 심지어 야비함까지 느끼며 그렇게 힘겹게 남모르는 산소 호흡기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2009년도를 보내고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 지금. 그 당시 표현을 어떻게 적을까 무척 고민도 된다. 하여튼 거래관계상 미수금을 정리하러 서울로 들어와서, 급기야는 2010년도에 푸켓 사무실을 정리해야만 했다. 인천 부모님 댁에는 말도 못하고 서울 종로의 한 여관방에서 몇 개월을 보내며 거래처 여행사의 한쪽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봐야만했다. 무척 아이러니했다. IMF 시절의 평행이론이라고나 할까. 난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다.
거래처 여행사의 빈 책상을 전전긍긍하며 일을 보는 사이 숙소로 있던 여관비도 밀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중 무교동의 한 거래처 랜드 사무실에서 책상을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날로 사무실을 무교동으로 옮기며 숙소도 을지로의 한 고시원으로 정했다.
“그래 딱 일 년만 고시원 생활을 하자”
난 그날로 정말 거짓말 같이 딱 일 년 동안 버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충정로 오피스텔을 얻게 됐다. 그리고는 태국 코사무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자기를 아직도 사랑해”
이말 한마디였다. 그리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흐느끼는 소리만 핸드폰너머로 울리고 있었다. 러브어스의 서울이 그렇게 시작됐다.
집사람과 약 5년간 떨어져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조우를 한 순간 너무 초라한 모습의 집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사랑스러워 보였다. 인천공항서 충정로 오피스텔까지 오는 공항버스 안에서 내내 서로의 손을 깍지를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래처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집사람과 합쳐 다시 일한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난 거기에 힘입어 박차를 가했다. 소개를 통해 거래처도 늘어나고, 이번엔 내가 한국에서 현지로 팀을 보내는 역할을 했다. 푸켓 사무실은 정리할 당시 우리 직원이었던 모 부장에게 맡기고, 방콕사무실은 후배가 하는 곳에 그리고 인도차이나 지역은 내가 푸켓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이 현지 여행사를 차린 곳으로 수배를 했다.
또 한 번의 매력적인 일이었다. 수년간 현지서 팀을 받아서 운영해오던 내가 거꾸로 현지로 행사를 맡기는 역할을 하니 더없이 즐겁게 일을 했다. 서울에서 일을 하며 거래처와 저녁에 술자리를 자연스럽게 가질 무렵 난 가수 조용필의 ‘고독한 러너’라는 노래에 빠지고 말았다.
“지쳐 쓰러져도 난 달려가리라. 푸른 바다의 파도가 되어~! 우리 인생이란 머나 먼 길에 나는 고독한 러너가 되어~”
그렇다. 우린 지쳐 쓰러져서도 안 되는 마라토너가 돼야 하고, 또 푸른 바다의 파도처럼 강해야 하며, 가볍지 않고 멋진 고독한 러너가 돼야만 한다. 그게 우리 업무를, 러브어스를, 진정 사랑하며 잘 되게 하는 길일 것이다.